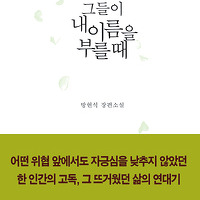[지나간 책 다시읽기]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

필자는 15 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 왔다. 동화와 위인전으로 시작해, 역사 소설을 지나 추리 소설을 섭렵했고 대중 소설과 인문/역사를 훑었다. 그리고 최근에야 비로소 흔히 말하는 고전 문학에 발을 들여 놓았다.
주로 손이 가는 문학 작품을 보니 미국 소설들이었다. 그것도 주로 20세기 초. 아무래도 그 무렵에 유행했던 하드보일드한 문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당시 미국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지금 내가, 우리가, 이 시대가 쳐한 상황에 잘 먹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상이나 기호에 심취한 유럽 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 문학은 거의 접해보지 못하였다. 러시아 문학계에는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즐비함에도 말이다. 부끄럽게도 접한 작품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푸슈킨의 <대위의 딸>, 체호프의 단편들, 그리고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정도이다. 손이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아이러니한 건 몇 안 되는 이 책들 중에서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가, 필자의 필생의 책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즉,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소설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문학은 접하지 않았을지라도 솔제니친은 잘 알고 있으니, 그 차이는 러시아 문학의 19세기 전성기와 솔제니친이 활동했던 20세기 중반 사이의 깊은 슬럼프만큼 깊다.
얼마 전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석영중 교수의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예담)를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몇 번이나 접했던 소설이었건만 '음식'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하는 사실 아닌가. 석영중 교수는 이 소설을 두고 "먹는 얘기가 없으면 소설이 존재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의 거의 끝 부분에 다뤄지는 내용이었는데, 처음부터 자세히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석영중 교수는 비단 이번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전작을 통해서도 러시아 문학을 다각도로 파고 들었다.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예담),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예담)처럼 위대한 대문호를 소설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나 인생을 두고 논했다. 또한 많은 러시아 문학들을 번역하였고, 그 와중에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음식과 먹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는 제목대로 러시아 문학과 문학가들에 얽혀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분명 새로운 시도이다. 러시아 문학을 완전히 섭렵한 학자가 계속해서 연구를 정진하면서 다른 것에도 눈을 돌려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낸 것이나 다름없다. 해서 비록 러시아 문학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많은 관심이 가지 않음에도,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책이었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파트는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로 빚어진 '남의 것'과 '나의 것'의 대립에서 빚어지는 문학과 음식 이야기. 두 번째 파트는 서기 988년에 러시아에 이식 되는 동방 그리스도교로 인해 빚어지는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의 대립. 세 번째 파트는 1917년 혁명으로 가시화되는 '옛 음식'과 '새 음식'의 대립. 러시아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음식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세 파트 사이에 적절히 배치되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 그들의 삶과 사상, 문학을 음식과 엮어 간략히 살펴 보자. 푸슈킨은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음식을 탐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박한 식성이었던 것이다. 그의 소박한 식성은 그의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와 소설의 소박한 분위기, 소박한 주인공과 주제 등으로 나타난다.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의 식성과 그의 문학과 전기. 아직까지는 신기하다고 말할 수밖에.
고골은 러시아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가는 대식가이자 식도락가였다고 한다. 그는 글쓰기 외에 유일한 관심사가 요리와 식도락이었고, 자연스레 오로지 먹는 일에 투신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받은 종교교육 등으로 자신의 식욕을 끔찍히도 부끄러워 했다.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나고 나서부터 광신에 가까운 신앙생활에 돌입한다. 이후 '육체의 양식'을 깡그리 무시했고,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음식으로 빚어진 비참하기 그지 없는 최후였다.
체호프는 음식의 코드에 의존해 범속한 일상을 전달했고, 톨스토이는 여러 저술을 통해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며 쾌락으로서의 식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가 추구했던 도덕적인 관념 체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음식이란 기본적인 생존 조건에 지나지 않았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 한 명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일 것인데, 그래서 그는 음식에 대해 관대했다고 한다. 고골처럼 폭식에서 단식을 경험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고, 톨스토이처럼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푸슈킨처럼 소박한 식성도 아니었다. 애초에 소식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필자가 종종 스스로에게 또는 주위 사람에게 음식과 삶에 대해서 묻는 말이 있다.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어?"
물어봐 놓고도 항상 스스로에게 계면쩍어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에 너무나 광범위한 철학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들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보냈을 진데.
필자의 생각도 저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 지에 대한 답을 찾아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음식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말이다.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제쳐둘 수는 없다.
"식사의 본질은 맛있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데 있다."(에필로그 중에서)
'지나간 책 다시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메마르고 음습한 시대를 담백하게 헤쳐나갔던 김근태를 그리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4) | 2015.07.24 |
|---|---|
| 대한민국의 탄생은, 반공산주의이자 반자본주의 하에서 였다? (4) | 2015.03.25 |
| <나는 전설이다> 종말이 휩쓸고 간 자리에... 혼자 남겨진 나는? (4) | 2015.03.04 |
| <역정> 리영희,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4) | 201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