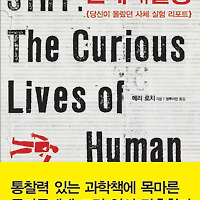[지나간 책 다시읽기]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세계 문학을 논하게 되면, 주로 미국과 유럽을 언급하게 된다. 물론 수많은 좋은 작품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이용해 세계의 문화를 흡수하고 분석해온 바,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작품들을 많이 써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어찌 되었든, 문학 또한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탁월한 문학성과 특유의 지역성으로 타파한 나라가 있다. 바로 남미이다.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학에 있어 거의 공통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는 문학을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환상적이고 기괴하기까지 한 배경과 분위기에, 남미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반영하였다. 일찍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향유하고 있던 역사와 함께, 그것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파멸된 역사, 그리고 하류 국가로 전락한 뒤 다시금 비상하고 있는 지금. 세계 최고의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은 환상적인 배경을 연출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몇몇 생각난다. 가르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콜롬비아),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페루), 파블로 네루다(칠레),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아르헨티나), 마누엘 푸익(아르헨티나), 그리고 파울로 코엘료(브라질)까지. 이들 중 세 명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경력도 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바로 '강렬함'과 '이질감'. 아마 이질감에서 오는 강렬함일 것이다.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느꼈던 이질감과 친숙함 사이의 아이러니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고, <픽션들>에서 느꼈던 난해함은 따라갈 소설이 없다.
남미 문학의 정수를 이어받다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는 이런 남미 문학의 정수를 잘 이어받았다.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환경 소설'이라 할 만한 이 소설은 환상적인 배경에, 스피디한 전개에, 강렬한 장면들의 연속에, 남미 역사와 특유의 지역성까지 망라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정말 재미있다. 이는 남미 문학의 정수를 이어 받음과 동시에 작가 개인의 삶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작가로 정식 활동을 하기 전에,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군부에 의해 추방당했고, 인접 국가를 떠돌며 망명 생활을 했다. 그 중 밀림 생활이 포함되어 있고, 이 생활은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의 구상으로 이어진다.
이 소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정확하다. 애돌아 말하지 않고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장소는 아마존 밀림의 '엘 이딜리오'라는 곳이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라 불리었다. 정부가 아마존 유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 이딜리오로 이주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들에게 결코 실현되지 못할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인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 부부도 그 중에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얼마 안 가 죽고 만다. 노인은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밀림으로 들어가 수아르 족과 같이 지내게 된다.
한편 현재의 엘 이딜리오에서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진다. 성인 백인 남자의 시체가 선착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체의 얼굴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읍장은 이를 야만인들이 일으킨 짓이라고 단정한다. 그의 논리에는 '야만인=나쁜 놈'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반면 노인은 정확하고 이성적인 논리와 추리에 의해 이를 암살쾡이의 짓이라고 단정한다. 야만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인 제공을 오히려 백인이 한 것이었다. 백인이 새끼 살쾡이와 수살쾡이를 잔인하게 죽였고, 이를 본 암살쾡이가 잔인한 복수를 한 것이었다.
이후 노인은 읍장을 비롯해 사냥 베테랑들과 함께 암살쾡이 사냥을 위해 길을 나선다. 사실 그는 능력을 감추고 조용히 연애 소설이나 읽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암살쾡이와의 조우를 통해 이 '빌어먹을 게임'을 끝내야 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결말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피할 수 없는 피해자들끼리의 싸움
문명의 이기를 앞세워 평화롭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밀림의 생물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한 제국주의 백인들. 그 백인들은 아직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밀림에 '야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각종 학살을 자행한다. 자신들의 기준을 들이대며 미개하고 문화 수준이 낮은 이들을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개조하려는 것이었다. 개조 이후에는 지배만이 남아 있다.
이분법적 사고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가만히만 있겠는가? 저항을 한다. 저항을 하면 이를 야만인의 야만적인 습성이라 폄하하고 이제는 '개발'이 아닌 '정화'의 미명 하에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이다. 이분법적 사고는 상대적 우위의 개념에서 선과 악의 개념으로 옮겨간다. 어느새 야만인들은 악(惡)의 존재가 되어 버린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에서 주인공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존재이다. 야만인은 아니지만, 야만인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였다.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노인은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얘기해주는 연애 소설을 보며 지내고 있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노인에게 유일한 삶의 낙이자 어쩔 수 없는 제3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건의 원인과 주체는 정작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두 개체 간의 싸움. 피와 눈물이 뒤섞인 이 싸움에서 승리자와 패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피해자일 뿐이다. 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의 싸움은 너무나도 처절하다. 더욱 처절하고 슬픈 건 우리네 대부분이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바꿀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이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뇨는 틀니를 꺼내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는 그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백인에게, 읍장에게, 금을 찾는 노다지꾼들에게, 아니 아마존의 처녀성을 유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낫칼로 쳐낸 긴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엘 이딜리오를 향해, 이따금 인간들의 야만성을 잊게 해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연애 소설이 있는 그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본문 속에서)
'지나간 책 다시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더 씨드> 문익점의 목화씨가 도요타 자동차가 됐다? (4) | 2014.02.19 |
|---|---|
| <인생>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6) | 2014.02.07 |
| <인체재활용> 죽음, 꼭 지루해 할 필요는 없지 않아? (13) | 2013.12.18 |
| <타잔> 친숙함으로 포장되는 흉악함의 정당화 (14) | 201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