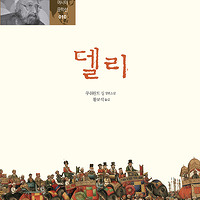[서평] <소설가의 일>

바야흐로 글쓰기의 시대다. 자기계발, 힐링, 인문학 열풍을 넘어 글쓰기까지 왔다. 글쓰기는 자기계발 요소, 힐링 요소, 인문학 요소까지 포괄한다. 더군다나 열풍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일 수 있으려면 대중을 상대로 해야만 하는데, 그렇다는 건 일반 대중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책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책을 만들려는 욕구는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곧 대중들의 시선이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전에는 책에서만 얻을 수 있던 것들을 더 이상 책에서만 얻을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는 얻은 정보들을 전해주려 한다. 이럴 때 문학과 같은 비실용서는 설 자리를 잃기 십상이다. 소설, 시, 산문 등. 읽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책들. 그래서 같은 글쓰기지만 '소설 쓰기', '시 쓰기'와 같이 그 자체는
실용적이지만 비실용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 책은 시장적 가치가 적다.
산문으로 시작해서 소설 쓰기로 끝나는 글
그런 면에서 김연수 작가의 신작 <소설가의 일>(문학동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위에서 말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책은 산문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가의 일을 담담하고 유머러스하게 자기 비하까지 섞어가며 재밌게 담아냈다. 그런데 이 책의 실제 정체는 '소설 쓰기' 실용서이다. 소설가의 일이란 게 소설 쓰기인 만큼 자연스러운 전개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위치는 애매모호해진다. 짧은 글들이 산문으로 시작했다가 소설 쓰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산문이라는 것을, 그 중에서도 에세이라는 것을 수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계몽적인 면모가 들어가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만다. <소설가의 일>은 자신의 이야기로 자기계발을 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소설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소설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설은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잔잔한 감동까지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저자는 '펄펄 끓는 얼음에 이르기 위한 5단계' 라는 애매모호하고 오글거리며 다분히 소설가의 문장스러운 장을 통해 소설가의 '쓰기'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설파한다. 그 5단계 제목들만 나열해본다. 이 제목들도 다분히 소설가스럽다. 즉, 에세이답다. 하지만 내용은 자기계발적이고 실용적이다.
1.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생각할 생각도 하지 말자.
2. 쓴다. 토가 나와도 계속 쓴다.
3. 서술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토해놓은 걸 치운다.
4.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면 감각적 정보로 문장을 바꾸되 귀찮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5. 소설을 쓰지 않을 때도 이 세계를 감각하라.
자기계발인데 계몽적이지 않다, 비호감이 아니다
한편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비록 자기계발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 시켰지만 전혀 비호감이 아니라는 것. 자기계발적 요소는 분명 계몽적이지만, 이 책에서는 계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20년 소설가의 내공으로 독자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분명 소설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소설가가 될 생각이 꿈에도 없는 사람이 읽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 저자는 단지 제목대로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시장적 가치까지 가질 수 있었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한 발을 실용에 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시대에 산문의 힘을 보여줬다.
저자는 소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다. 먼저 '열정, 동기, 핍진성', 다음으로 '플롯과 캐릭터', 마지막으로 '문장과 시점'이다. 이 책을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공식(?)이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 + 그에게 없는 것) / 세상에 갖은 방해 = 생고생(하는 이야기)'란다. 이것이 저자가 언제나 쓰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소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핍진성'이다. 핍진성은 뒤에 나오는 플롯과 캐릭터보다 중요한데, 뜻은 '서사적 허구에 사실적인 개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수용하는 관습화된 이해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소설 창작의 한 방법'이다. 저자는 핀집성이 소설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라고 말한다.
플롯과 캐릭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정, 몸짓, 행동'이다. 저자는 소설가가 하는 일이란 바로 이 표정 및 몸짓과 행동을 알아내는 것이 전부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절망'과 '좌절' 그리고 '회복'을 붙이면 소설의 플롯과 캐릭터가 완성된다. 이때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소설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표정과 몸짓과 행동으로 표현해내야 한다.
문장과 시점, 그 중에서도 문장은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설가의 일 중에 하나다. 자연스레 소설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문장에 대한 건 저자의 말로 대체한다.
"소설가는 문장만을 쓴다. 글을 쓰기 위해 앉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거기에 내가 쓸 내용 같은 건 없다고. 오직 문장뿐이라고. 그것도 한 번에 하나의 문장뿐이라고. 내용이야 어떻든 쾌감을 주는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을 뿐이라고.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잘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하게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고치는 사람, 그게 다다." (본문 중에서)
소설가가 말하는 '소설가의 일'
책을 읽어보니 소설가가 하는 일이 참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설가의 일이란, 어두침침한 방안에서 부수수한 머리를 헝크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원고지를 수십 장 찢어버리기도 하고 술까지 마시면서 힘들게 힘들게 한 자 한 자 써서 소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다지 할 일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일 뿐이다.
반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소설가의 일은 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아니 그렇게 보인다. 저자는 본래 소설가의 일을 말했을 뿐이다. 저자가 소설가의 일을 쉽고 재밌게 전달했지만 소설가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닐 것이다. 이 책을 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됐다. 소설가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알게 되었으면 족하다. 소설가가 되는 일에 대한 부분은 덤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 소설가의 일 - |
'신작 열전 > 신작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안내서 (3) | 2014.12.22 |
|---|---|
| <내 가족의 역사> 파격적인 시도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0) | 2014.12.15 |
| 우리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델리의 삶, <델리> (0) | 2014.12.01 |
|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잡지 위기 시대에 잡지의 역사를 들여다보다 (0) | 201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