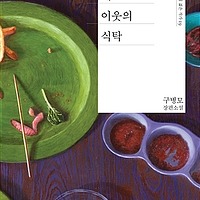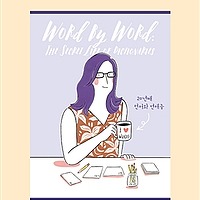[서평]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

장강명 소설가는 자타공인 2010년 이후 문학공모전 최대 수혜자다. 2011년 한겨레문학상, 2014년 수림문학상, 2015년 문학동네작가상과 제주4.3평화문학상까지. 한 소설가가 네 개의 문학공모전 수상을 한 건 그 이전에 없었고 아마도 그 이후에도 없을 것 같다. 그는 문학상을 받을 만한 문학적인 소설을 쓰는 소설가일까?
그는 1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일했다. '이달의 기자상' '관훈언론상' '대특종상' 등 기자로 일찌감치 이름을 높였다. 기자로 일하던 와중 한겨레문학상을 탄 작품이 <표백>이다. 기자 출신다운 건조한 문체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거기에 어떤 '문학적인' 느낌이 들어서 있지는 않은 듯하다.
장강명은 이후로도 계속 비판적인 어조로 현실을 날카롭게 조명한다. 그의 소설은 장르소설 또는 대중소설 쪽에 더 천착한 듯하여 한국문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순문학과는 거리가 멀어보임에도, 한국문학계의 주류 중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문학공모전 최대 수혜자이다. 그 아이러니는 곧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또는 실마리.
그는 그 아이러니를 누구보다 잘 인지한듯, 한국문학계에도 또한 자신에게도 파격적인 소설 아닌 르포 <당선, 합격, 계급>(민음사)을 들고 왔다. 이 책은 문학공모전과 공채제도의 기원과 선발 메커니즘, 영향력을 수치와 팩트에 입각한 저자의 조심스럽지만 물러서지 않는 생각으로 알려온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한국 사회'이다. 공채와 간판과 계급의 시스템이 낳은 좌절의 한국 사회.
좌절의 시스템, 문학공모전과 공채제도
문학공모전과 공채제도, 이 둘은 굉장히 한국적인 제도로 대규모 동시 시험을 치러서 인재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곳은 한국 말고는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자는 한국 소설과 한국 사회가 서열구조와 관료주의로 역동성을 잃어가는 건 상당 부분 이 제도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두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대학 입시를 생각해보자. 간판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우리나라 대학, 사활을 걸고 입학하여 간판을 걸고 나면 또 다른 간판이 보인다. 이젠 대학은 중요한 게 아니니, 대학에의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한다. 한편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 생기고 내부 결속력은 강해진다. 관료 집단의 출현이다.
그럼에도 두 제도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고 공정하며 제너럴리스트를 뽑기에 좋은, 장점 많은 제도이다. 똑같은 시험을 동시에 치르고 같은 기준 하에 당선자와 합격자를 고른다.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주의와 당파성이 그나마 옅은 제도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한 서열과 간판과 계급의 시스템, 즉 다수에게 지극한 좌절을 안겨주는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다. 마땅한 대안 없이 그저 기존의 제대를 유지할 뿐이다.
저자는 문학공모전과 공채제도가 좌절의 시스템이라 확신하는 듯한데, 최소한 이대로 존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면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까 하는 대안이 있을까?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걸까? 그 스스로가 문학공모전이 생기고 난 후 최대 수혜자임에도?
독자들의 문예운동
장강명은 그다운 대안을 제시한다. 시선을 달리하는 것이다.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병폐인 서열과 간판과 계급의 본질적인 힘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간판의 힘이 정보 부족에서 나온다 보고 사람들에게 지도를 그려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대안이다.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충분한 보상과 실패의 대비책은 많은 비용이 들고 그에 대비한 파급력이 작을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문학계에서의) 대안은 새로운 종류의 운동, '독자들의 문예운동'이다. 우리 문학계의 기존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거나 묻히기 쉬운 작가들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찾아내고 응원하는 운동이다. 그 중심에 '서평'이 있는데, 협동조합 롤링다이스의 북큐레이션 뉴스레터 '비:파크레터',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밀리의서재', 독서 문화 잡지 월간 <책>의 인포그래픽 서평, 저자가 기획한 서평집 <한국 소설이 좋아서>, 서울 성북구의 '책읽는성북' 독서 운동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
그의 '간판 소설' <한국이 싫어서>(민음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이 소설은 헬조선을 탈출해 호주로 떠났지만 그곳도 헬호주였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헬조선이 헬조선이 되는 본질적인 힘을 허물어야 하지 않나? 대안도 대안이지만 논쟁거리가 다분하다.
논쟁에서 대안으로, 대안에서 실천으로
<당선, 합격, 계급>도 마찬가지로 논쟁거리가 다분하다. 완전한 해결 뒤 변하지 않고 굳어져 가는 시스템 대신, 치열하고 생산적인 논쟁이야말로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나도 저자가 바라보는 현실과 저자가 생각하는 대안에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문학공모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 책에서 말하는 현실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거니와, 양자택일 아닌 본질을 생각하는 대안에 찬성한다.
하지만 저자가 과연 진정으로 이 문제, 즉 문학공모전과 공채제도에 관심을 갖고 당사자로서 해결을 하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저자는 이 제도를 한국 사회의 병폐인 서열, 간판, 계급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수단으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들여다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며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고 말한다.
나아가, 저자가 내세운 대안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일반 독자가 '왜' 나서야 하며 '어떻게' 나설 수 있겠는가. 더욱이 저자 또한 책에서 '내 의견이 정답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라며 미리 발을 빼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난 저자가 말한 대안에 발맞춰 나서서 하고 싶다. 나서야 할 이유도 있고 나서서 할 능력도 있다. 하지만 난 유명하지도 않고 이 제도들에 발을 걸치고 있을 뿐 엄연한 당사자는 아니다. 저자는 해야 할 이유도 있고 할 능력도 있으며 당사자로서 대안 이후의 실행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이 부디 그 결과물이 아닌 시작이길 바란다. 그러하다면 미미한 힘이나마 힘껏 돕고 싶다.
'신작 열전 > 신작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언어 자서전 <문맹> (0) | 2018.07.23 |
|---|---|
| 공동체의 허위와 여성 삶의 본위를 폭로하다, 소설 <네 이웃의 식탁> (0) | 2018.07.20 |
| 누군가가 지금도 사전을 만들고 있다 <매일,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0) | 2018.06.18 |
| 중국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 책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 (2) | 201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