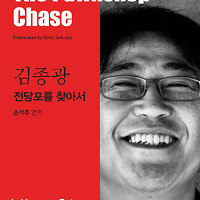[한국 대표 소설 읽기] <필론의 돼지>

"필론이 한번은 배를 타고 여행을 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자 사람들은 우왕좌왕 배 안은 곧 수라장이 됐다. 울부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뗏목을 엮는 사람… 필론은 현자인 자기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다. 도무지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배 선창에는 돼지 한 마리가 사람들의 소동에는 아랑곳없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다. 결국 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돼지의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었다." (본문 58~59쪽 중에서)
많은 사람의 정곡을 찌를 우화이다. 굳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게 마련이다. 관성의 법칙도 있지 않은가?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조급하게 나서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 현자가 보기에는 딱할 따름이다. 그러고 보니 필론이 현자가 아닌 거다.
필론과 돼지의 우화로 사회를 바라보다
이문열의 <필론의 돼지>는 필론과 돼지의 우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았다. 이 소설도 그의 스타일에 맞게, 어떤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곳에 여러 인간 군상을 배치시켰다. 곧 사회의 축소판이다. <필론의 돼지>의 특수한 상황은 이렇다. 1980년대 대학을 졸업한, 우쭐댈 만한 학력을 가진 주인공이 군대를 제대하고 군용열차에 올랐다. 그곳에서 멍청하기 짝이 없었던 훈련소 동기 '홍'을 만나고, 얼마쯤 지나 술 취한 '검은 각반 두른 현역' 즉, 특전사 현역이 난장을 피우며 돈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한다. 백 명에 육박하는 육군 예비역들은 다섯에 불과한 특전사들에게 꼼짝도 못하거니와, 그 또한 아무것도 못하고 똑같이 돈을 빼앗길 뿐이다.
그에게 특전사보다 앞 선 문제는 다름 아닌 홍이다. 본명이 홍덕동인 홍은 워낙 멍청했기에 '홍 똥덩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홍이 자꾸 자신과 맞먹으려 하는 게 아닌가. 그가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홍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홍은 분노는 커녕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반면 그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홍처럼 행동하고 만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어느 모로 보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과 섞이기 싫어할 때가, 그런데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그나 나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될 때가, 그렇게 분노와 좌절과 자기혐오를 느낄 때가 말이다. 내가 그 반대로 못한 사람일 때는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못하곤 하는데, 하필 내가 잘난 사람인 것 같을 때는 그렇게 되곤 한다. <필론의 돼지>에서 그는 현자 필론이고, 홍은 돼지일 거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말짱 황'이다.
정작 중요한 건 '폭력'의 정당성 여부
술취한 특전사 현역 다섯 명이 육군 예비역 100여 명이 몸을 실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객실로 난입해, 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며 돈을 갈취한다.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3년 간 '당했던' 뼛속 깊은 무력감으로 순순히 돈을 준다. 종종 저항의 불꽃이 일지만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사그라든다. 그 또한 분노로 치를 떨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익명의 목소리가 들린다. 100명이 다섯 명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한다. 다같이 달려들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말한다. 이 선동에 맞춰 수많은 발길질이 특전사 현역 다섯이 아닌 한 명씩으로 향한다. 아무리 단련된 그들이라고 당해낼 도리가 없다. 무참히 쓰러져 얼마 전까지 그들이 행했던 바를 그들이 당한다. 소수 권력의 무참한 말로다.
이 지점이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지식인이 행동하지 않을 때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바는 '폭력'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생각을 빌어 폭력의 악순환을 비판하고자 한 것 같다.
"만약 이들을 진실로 죽여야 할 대의가 있다면, 그에게도 동료 제대병들과 함께 살인죄를 나눌 양심과 용기는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눈먼 증오와 격양된 감정이 있을 뿐, 대의는 없었다."(본문 68쪽 중에서)
지배자의 폭력과 피지배자의 폭력은 같지 않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 것일까. 주인공의 눈에는 지배자의 폭력과 피지배자의 폭력이 같아 보이는가. 작가도 그렇다. 주인공이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대의가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주인공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건 어불성설이다. 물론 하나의 우화로 작동하는 것이겠지만, 폭력에 대한 생각은 우화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일제 시대 친일 부역자들을 모조리 잡아 그에 맞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야, 하면서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많이 오버된 것 같지만, 충분히 같은 맥락이다.
물론 크게 보면 특전사 현역이나 육군 예비역이나 국가와 시대가 낳은 피해자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생각이 일언반구 들지 않게 한다. 단지 폭력에 당한 만큼 폭력으로 갚는다는 것이 대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 뿐이다. 현상만 볼 뿐 본질은 보지 '않은' 것 같다. 본질을 보았으면, 한 발 더 나아가 폭력과 폭력이 만나게 된 그 상위층의 폭력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못지 않은 탁월한 알레고리 형식으로 1980년대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 이 소설은,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좋게 말해 논란 거리가 되는 바를 남겼다. 그럼에도 하나는 확실하다. '필론의 돼지'는 1980년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어떻게 보든 '그들'은 분명 혐오스러운 존재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들'일까.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도 여전히 혐오스러운 존재일까. 문제는 그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혐오스러운 존재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다. 필론의 돼지가 스스로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
아시아 출판사가 후원하는 '한국 대표 소설 읽기'의 일환입니다.
'바이링궐 에디션 한국 대표 소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나간 책 다시읽기 > 한국 대표 소설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망치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무진기행> (0) | 2016.07.06 |
|---|---|
| 1998년 한국사회의 웃픈 자화상 <전당포를 찾아서> (0) | 2016.06.29 |
|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다 <회복하는 인간> (1) | 2016.05.27 |
| 짊어지지도 짊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전쟁의 비극 <아베의 가족> (4) | 201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