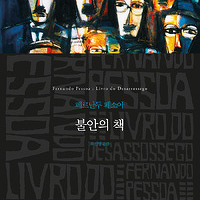지난 6월이었죠? 한국을 뒤흔들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신경숙 표절 사태. 한국 전체로 보자면 메르스가 훨씬 깊고 넓게 알려졌지만, 신경숙 표절 사태가 출판계와 문학계에 끼친 영향에 비해서는 작게 느껴집니다. 신경숙 표절 사태가 메르스 사태 이슈의 유일한 대항마였으니까요. 적어도 문학계에서는 역대 최악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곧 오랫동안 한국 문학계를 장악했던 문학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문학권력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했죠. 먼저 '문학동네' 창간부터 20년을 함께한 편집위원 1기가 2015년 겨울호를 끝으로 전원 사퇴합니다. 편집위원 중 한 명인 서울대 서영채 교수가 겨울호 권두에 '작별인사'를 남겼죠.
"권력이라는 말은 '권위 있는'보다는 '권위적인'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문학권력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니 이제는 내려놓자. 그것은 저에게 일종의 직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신경숙 표절 사태의 장본인과 같았던 '창비'는 더 큰 결심(?)을 했죠. 창비 그 자체와 다름 없는 백낙청 편집인의 사퇴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창비 통합시상식’ 자리에서 그는 “창간호의 편집인이었고 (...) 지금까지 편집인 자리를 지켜왔다. 편집인을 그만둔다 해서 출판사 창비를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니다. 계간지 일에서만은 깨끗이 손을 뗄 작정이다.”라고 밝혔죠.
그야말로 한국 문학계를 뿌리째 뒤흔든 대사건이라 할 만 합니다. 당연히 3대 문학권력인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문학동네' 계간지 모두와 '실천문학' '자음과모음' 등의 문예지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태를 다뤘죠. 가을호를 넘어 겨울호까지, 2015년 하반기를 강타했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사실 저 정도면 문학권력의 뿌리를 드러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장본인들이 사퇴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문학권력이 사라질까요? 모든 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지금, 보여주기 식의 사퇴로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문학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죠. 독자들이 나서는 것도 좋겠죠. 또한 비록 철저히 자본주의에 종속된 사기업 출판사일지라도, '공공재'이자 '예술'인 책과 문학을 다루는 만큼 다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해요. 사회적 환원과 순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출판계와 문학계에 다양성을 투여해야 합니다. 즉, 권력이 분산될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 '표절 사태'와 '문학권력'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건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과하는 것도 좋고 사퇴하는 것도 좋은데, 왠지 '빨리 빨리 할 거 하고 지나가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거죠. 수면 아래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범국민일 수는 없겠지만, 범출판계, 범문학계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독자분들이 한국 문학에 등을 돌린 거 겠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로 눈을 돌려 힘을 쏟아야 해요. 지금과 같이 계속 가다간, 그냥 집밖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것 같거든요.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부디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완전히 다르게요.
'생각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블로그 어워드 2015' 한표 부탁드립니다^^ (2) | 2016.01.13 |
|---|---|
| 애증의 대상, 고 김영삼 전 대통령 (5) | 2015.12.09 |
|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책> 간단히 톺아보기 (0) | 2015.10.25 |
| 문학으로 인류에 공헌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6) | 201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