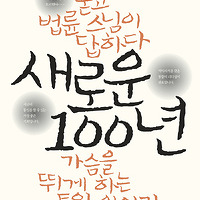[서평] 박찬운의 <문명과의 대화>

호머의 <오딧세우스>,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이후 '여행기'를 읽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모험담을 골자로 하는 여행기를 읽을라치면, 이 두 작품만 읽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은 법. 지난 수 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여행기들이 쏟아졌다.
해외여행 한 번쯤 안 간 사람이 거의 없지만, 또 막상 가고자하면 못 갈 이유도 수두룩하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자 한 것인지, '세계일주 여행기', '배낭 여행기', '홀로 여행기' 등의 서적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 배낭족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을 완벽하게 해부·분석·정리한 책들은 실용서의 막강한 콘텐츠들이다.
관광을 넘어선 문화적 요소가 풍부한 여행서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여행에서 뭘 남길 수 있을까. 이를 이용해 먹는 소비성 여행기를 보고 어떤 감흥이 들까. 필자도 해외여행을 몇 차례 하려고 했지만,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겪기만 해서는 남는 것이 없었다. 또한, 여행기에도 어떤 요소가 필요했다. 관광을 넘어선 문화적 요소가.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박찬운의 세계문명기행'을 보면, 분명 기존의 여행기와는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일종의 방법론적 차원으로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인 저자는 인권을 더욱 깊고 넓게 알고자 인간(인문)을 공부했고, 인문의 뿌리를 알고자 인간이 이륙한 찬란한 문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다.
이번에 이 연재가 묶여져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제목은 <문명과의 대화>(네잎클로바). 기행이나 여행이 아닌 '대화'라는 제목이 와 닫는 이유는, 저자가 글을 풀어가는 방식 또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책은 여행을 주요 골자로 하면서도 그 지역에 관련된 문화, 역사, 철학 등의 인문적 지식을 총동원해, 말 그대로 독자와 대화를 시도한다. 때론 저자 자신의 사변적인 이야기를, 때론 상당히 깊은 통찰의 역사 지식을, 때론 여행 에세이 같은 잔잔한 글감을 풀어놓는다.
이는 마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기술한 '여행기'라기보다, 체계적인 편람이나 지리서 나아가 설명서로 느껴지고 읽혀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방견문록>은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낌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 반면, <문명과의 대화>는 개인적인 감상과 느낌 그리고 이에 관련된 다방면의 서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서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마르코 폴로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식으로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럽인들에게 낯선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과 설명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마이뉴스> 연재 제목인 '세계문명기행'보다 '문명과의 대화'가 더 알맞은 제목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동방견문록>은 책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상당히 판이한 제목이었다. 본래 제목인 <세계의 서술>이 알맞은 제목이다.
<문명과의 대화>는 총 4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다. '나일 문명기행', '페르시아 문명기행', '실크로드 기행',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기행' 한꺼번에 이 문명을 여행한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다른 환경에서 여행을 하였다. 각 부가 끝날 때마다 에필로그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손에서 책을 놓고 여운을 즐기게 된다. 여행기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여운과, 갖가지 정보로부터 오는 지식의 향연을 만끽해본다.
하지만 이 지역들의 모습, 관련된 지식들을 올곧이 받아들이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누군가에겐 이 책이 여행기로서의 매력도, 인문서로서의 매력도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류가 이룩한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 '조곤조곤' 설명
세계적인 관광지들이지만, 그곳에 주로 역사적인 유물이나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 즐비하기에 마음껏 즐길 수만은 없다는 점이 걸린다. 많은 지식들을 담으려 한 것은 좋으나, 기본적으로 관련된 역사적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기에, 외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린다. 저자도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시종일관 아마추어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한도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곤조곤'이라는 표현이 이만큼 어울리는 책도 드물 것이다.
인류가 이룩한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 하지만 대자연 앞에서는 인류가 수천 년 간 쌓아온 문명조차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연환경에 도전하면서 그에 적절히 응전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인류의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명의 기원에서 자연환경이 주는 영향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도전과 응전에 제대로 적응하면 우수한 문명을 일으킨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정적으로 자연의 역습을 받는 것이다."(본문 속에서)
책은 거대한 호수 위에서 태어나 수상 가옥을 짓고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즉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끝난다. 그리고 저자의 4개 문명 여행도 막을 내린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를 운치 있게 그려냈다.
아쉬운가? 저자의 여행은 여기서 끝일까? 그렇지 않다. <오마이뉴스>에서 '박찬운의 세계문명기행' 연재는 계속되고 있다. 한창 로마문명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다. 더욱 글로벌해지고 시의성이 짙어졌다. 자못 기대된다.
"오마이뉴스" 2013.7.1일자 기사
'신작 열전 > 신작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류에게 대재앙을 선사할 쓰레기... 그 해법은? (10) | 2013.07.22 |
|---|---|
| “당장 내일이라도 남북이 손을 잡고 통일을 했으면 해요" (10375) | 2013.07.10 |
| 우리 집을 '카페 스타일'로 꾸며 보세요 (4) | 2013.07.03 |
| 내가 더 피로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 끝은? (36) | 2013.07.01 |